20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신생 학회에 Organizing Committee로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원래 Organizing Committee는 교수들이 하는데 내가 졸업이 임박한 터라 지도교수가 추천해 줘서 (내가 그 말로만 듣던 낙하산?) 커미티에 들어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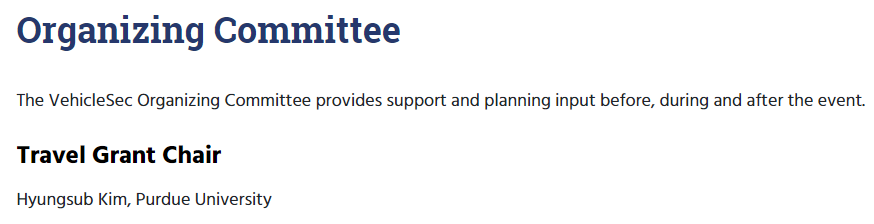
정말 나에게는 귀중한 경험이였는데 내가 느낀 바를 남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공유하면 좋을 거 같아서 오랜만에 (한글로!) 글을 쓴다.
- 나는 한국에서 석사할때나 미국에서 박사 할 때나, 여태 학회참여 할 때 돈이 없어서 못 간 적은 없었다. 심지어 직장 다닐 때는 내 돈으로 내 개인 휴가 써서라도 학회 가서 발표했었다. 한국은 다행히 BK21사업 때문에 1인당 300만원 한도로 학회 여행비용을 지원해 줬었다 (역시 한국 최고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참...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하더니 정말이다. 작은 규모의 학교들은 본인 학생들을 학회 여행 비용 지원 못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았다. 심지어 학교가 큰 학교라도 연구과제가 없으면 학생은 학회에 못 간다! 그래서 Travel Grant를 신청해서 경비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이게 신청할 때 뭐 쓰라고 하는 것도 많고, 경쟁률도 심하고, 되더라도 세금관련해서 채워야 하는 서류들도 많고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다. 내 지도교수님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
- CS는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한다! CS에서 저널에 논문낸다고 하면 뭐 누구한테 협박당하고 있냐고 생각할 수 있다 (정말이다). 학회에서 논문 발표하고, 논문으로만 보던 대가들과 함께 연구이야기 하면서 마시는 맥주의 짜릿함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그런데 학회 Organizing Committee도 논문 발표하는 것 만큼이나 꽤나 성취감을 안겨준다. 나는 학회에서 논문 발표하는 대학원생이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Organizing Committee는 이름만 올려놓고 친목도모하는 걸로만 생각했다. 와 그런데 역시 세상은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잘 알 수가 없는 법이다. Organizing Committee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학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을 짜야하더라 (논문 accept ratio, program committe로 누굴 초대할지, travel grant를 어떻게 어디서 따올지, best paper award는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모든 선택의 문제들이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는터라, 이견도 많이 생기고 내가 결정해 놓고도 이게 맞는 건지 항상 찝찝하다. 연구하고 논문 쓰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논문이 가장 쉬운 거 같다 :( 내가 잘하면, 결과도 좋은 법이니까.
- 결론은 Organizing Committee는 꼭 경험해봐야한다 (나만 당할 수 없다?). 이런 Organizing활동 전혀 안하고 본인 연구만 하는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근데 그럴 거면 왜 교수가 된 거지?
'미국 대학교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포닥 (postdoc) 월급 실수령액 (2024년) (2) | 2024.04.25 |
|---|---|
| 미국 박사과정 생활비 정리 (2023년 버전) (0) | 2023.07.09 |
| 학회 vs. 저널 (0) | 2022.08.29 |
| Statement of purpose (학업계획서) (0) | 2022.08.20 |
| 동네 도서관 방문해보기 (0) | 2022.08.13 |